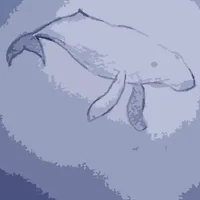얼마 전에 이사를 했다. 그래봐야 같은 고시원에서 방만 옮긴 것 뿐이지만, 관처럼 몸이나 겨우 누
일 수 있었던 방에서 침대와 침대만큼의 공간이 더 있는 방으로 옮긴 것은, 내 개인의 일상에 있어
서는 큰 변혁이다. 덕분에 집에서도 공부를 할만한 자리가 생겨 요새는 연구실을 뜸하게 찾는다.
밤마다 긴 시간을 들여 하고 있는 것은 석사 장르의 제재인 제문의 번역이다. 제문은 애제류의 하
위 장르인데, 제사를 지낼 때에 '유세차-'로 시작하여 낭송하는 정체 불명의 주문이 제문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우리 집은 아직도 때가 되면 큰집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제사
날이 되면 한복을 꺼내어 입고 제문을 써 내려가던 장면이 기억에 생생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 할아버지만이 괴상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가락으로 알지 못할 말을 길게
읊는 장면이 어린 내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문과 학사 4년동안 나름 힘써 공부했던 내용이래
봐야 고작 제문 관련 연구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에 석사 논문의 제재로 택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겠지만, 어쩌면 어린 날의 기억에 빚진 것도 꽤나 많을지 모른다.
저명한 문인이 청탁을 받아 한 번 본 적도 없는 이의 제문을 써 주는 일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의
제문은 글쓴이의 가족이나 벗, 스승 등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다. 문인에게 지인의 죽음만큼
절박한 집필 동기는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죽은 사람 굳이 욕할 것은 없으니 그 내용은 천편일
률적으로 효행이나 열행, 그리고 학업에 관한 설화 급의 칭찬 일색이기 쉬우나 때때로 빈궁하게 살
다 죽은 불우한 벗에 대한 슬픔이나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오열과 같은, 비극보다 더 비극같은
삶의 감정들이 먹의 질량과 글자의 형태에서 풀려나 전해질 때가 있다. 알고는 있다. 눈 앞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못 알아 듣는데 짧게는 백 년, 길게는 이천 년 이전에 쓰여진 글에서 본래의 감정을
그대로 전해 받았다는건 진실보다 착각이 더 클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슬프고, 듣고 난 뒤 내 삶을
다시 보게 하는 등의 모든 공효가 그저 심리적인 자위행위일 수 있다. 안다.
거의 모든 제문은 한문으로 쓰여졌다. 당연히 세로쓰기이고, 대부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 고작
종이 한 장 앞에 두고, 여기서 끊어보았다 저기서 끊어보았다, 죽어라고 안 되면 결국 내용으로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감고 아무데서나 끊어놓고서는 혹시 맞는지 읽어보기도 한다. 이따금 재수
좋게 한 장 무사히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날로 넘어가는 것이 평범한 순서이다. 연
필로 그었다 지웠다 했던 흔적을 다 지우고, 확실히 떼어야 하는 부분은 빨간 줄로 그어놓고 나머지
는 다시 비워둔다. 허리도 아프고 바람도 쐬고 싶고 공부하는동안 못 받은 전화에 답이라도 해야지
잠깐 나서며 시계를 보면, 이제 칠백 시간도 안 남은 나의 이십 대가 휙휙 지나가 있다. 반바지 입고
찬바람 맞으면서,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귀한 젊음 바쳐 가며 사람 죽은 얘기 붙잡고 있나, 싶기도 하
고. 아무튼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 죽었다고 따라죽은 여자도 있는데 열
심히 살아야지, 싶기도 하고.
일 수 있었던 방에서 침대와 침대만큼의 공간이 더 있는 방으로 옮긴 것은, 내 개인의 일상에 있어
서는 큰 변혁이다. 덕분에 집에서도 공부를 할만한 자리가 생겨 요새는 연구실을 뜸하게 찾는다.
밤마다 긴 시간을 들여 하고 있는 것은 석사 장르의 제재인 제문의 번역이다. 제문은 애제류의 하
위 장르인데, 제사를 지낼 때에 '유세차-'로 시작하여 낭송하는 정체 불명의 주문이 제문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우리 집은 아직도 때가 되면 큰집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제사
날이 되면 한복을 꺼내어 입고 제문을 써 내려가던 장면이 기억에 생생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 할아버지만이 괴상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가락으로 알지 못할 말을 길게
읊는 장면이 어린 내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문과 학사 4년동안 나름 힘써 공부했던 내용이래
봐야 고작 제문 관련 연구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에 석사 논문의 제재로 택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겠지만, 어쩌면 어린 날의 기억에 빚진 것도 꽤나 많을지 모른다.
저명한 문인이 청탁을 받아 한 번 본 적도 없는 이의 제문을 써 주는 일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의
제문은 글쓴이의 가족이나 벗, 스승 등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다. 문인에게 지인의 죽음만큼
절박한 집필 동기는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죽은 사람 굳이 욕할 것은 없으니 그 내용은 천편일
률적으로 효행이나 열행, 그리고 학업에 관한 설화 급의 칭찬 일색이기 쉬우나 때때로 빈궁하게 살
다 죽은 불우한 벗에 대한 슬픔이나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오열과 같은, 비극보다 더 비극같은
삶의 감정들이 먹의 질량과 글자의 형태에서 풀려나 전해질 때가 있다. 알고는 있다. 눈 앞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못 알아 듣는데 짧게는 백 년, 길게는 이천 년 이전에 쓰여진 글에서 본래의 감정을
그대로 전해 받았다는건 진실보다 착각이 더 클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슬프고, 듣고 난 뒤 내 삶을
다시 보게 하는 등의 모든 공효가 그저 심리적인 자위행위일 수 있다. 안다.
거의 모든 제문은 한문으로 쓰여졌다. 당연히 세로쓰기이고, 대부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 고작
종이 한 장 앞에 두고, 여기서 끊어보았다 저기서 끊어보았다, 죽어라고 안 되면 결국 내용으로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감고 아무데서나 끊어놓고서는 혹시 맞는지 읽어보기도 한다. 이따금 재수
좋게 한 장 무사히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날로 넘어가는 것이 평범한 순서이다. 연
필로 그었다 지웠다 했던 흔적을 다 지우고, 확실히 떼어야 하는 부분은 빨간 줄로 그어놓고 나머지
는 다시 비워둔다. 허리도 아프고 바람도 쐬고 싶고 공부하는동안 못 받은 전화에 답이라도 해야지
잠깐 나서며 시계를 보면, 이제 칠백 시간도 안 남은 나의 이십 대가 휙휙 지나가 있다. 반바지 입고
찬바람 맞으면서,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귀한 젊음 바쳐 가며 사람 죽은 얘기 붙잡고 있나, 싶기도 하
고. 아무튼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 죽었다고 따라죽은 여자도 있는데 열
심히 살아야지, 싶기도 하고.
'일기장 > 2009'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갑 (0) | 2009.12.03 |
|---|---|
| 7022번 버스 (2) | 2009.12.03 |
| 11월의 마지막 날 (0) | 2009.11.30 |
| 11월 25일 올드 이글스 對 핫독스 전 (0) | 2009.11.27 |
| 과학 기술의 발전이란 (1) | 200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