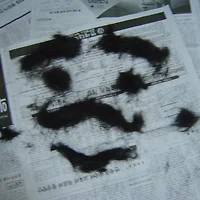지금 이야기를 하나 해 보자. 이야기는 역시 여자이야기라야 재미가 있다. 이야기는 내돈내고 PC
방 와서 레포트 안 쓰고 앉아 쓰는 이야기가 쓰면서도 재미가 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다.
때는 엑스포가 열리기 한해 전인 1992년으로 한정하자. 그러면 승학초등학교 5학년이고 나이는
케빈과 동갑먹는 열두살이다. 최대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 이거다.
동서고금에서 일급으로 꼽아주는 미녀가 언제나 그러하듯, 살짝 올라간 눈매에 탄력있는 피부가 한
방 제대로 먹어 주는 그녀의 이름은 내나이 열여덟 학익고등학교 2학년 4반 우리반 짱과 같은,
김민희.
아, 그 시간은 즐겁디 즐거웠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생각을 그 때 처음 했던 것도 같다. 누군가
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내가 더 즐겁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첫사랑은 아니
지만, 가히 첫 여자친구라 할만하다. 조숙하다 까졌다 어쩌구 이야기는 잠시 치워두자. 잠시 치워
둬 봐야 다시 이야기할 것도 아니니 그냥 잊도록 하자.
그래. 김민희가 있었다 이거지. 그럼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보자. 5학년 4반의 담임선생님의 성함은
노숙자 선생님이셨다. 워낙에 유쾌하고 외람되지만 발랄한 성격이시라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벌리셔서, 여기서 하나 예를 들고 넘어가자면 우리 반에서는 같이 앉는 짝도 자기가 같이 앉고 싶
은 아이를 골라 가지는 시간도 있었다. 여성의 상품화다라고 화내지 마시라. 소녀가 고르고 소년은
그 결과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런 짝고르기. 학기말이 가까워져 사실상 마지막 짝꿍을 고르게 되
었던 그 무렵에, 하필 그 무렵에 나는 민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 음란한 미국에서 자라난 케빈
도 여자친구가 인기가 좋은 데에는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 대는 와중에, 한국에서, 그것도 2003년이
되도록 제 1당은 한나라당 제1신문은 조선일보인 인천에서 잘도 자라난 열두살 소년은 실명을 거론
할 수 없는 어떤 친구가 민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의 비슷한 때에 그 사실을 민희
가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면서 대화를 줄이게 된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짝고르기라니 후회막급이다. 괜한 반항심으로 민희가 그 녀석이랑 앉으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 사과할걸 사과할걸하고 되뇌이고 있는데, 아 글쎄 민희가 당돌하게도 제 차례가 오자 선생님
의 '누구랑 앉겠니'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최대호요'라고 불러 준 것이다.
허허. 최대호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최대호'라고 내 성까지 불러 주
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권미랑은 태생적으로 점수를 반쯤 따고 들어가는 것
이나 다름없다.) 반장이나 회장님이나 의장님도, 오빠도 형도, 자기야 여보야도 다 그 나름으로 좋
지만, 최대호라는 이름만큼 내게 감흥을 주는 칭호는 없다. 그런 최대호를, 그런 민희가 대뜸 불러
준 것이다. 버릇없게시리 선생님 말도 기다리지 않고.
옆자리에 일단 앉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 내 얼굴이 사나워 보인다는
것을 민희는 잘 알고 있었고 민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또한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서로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하튼, 어찌할지 몰라 뚱하니 있는데 민희가 애기를 달래는 것처
럼, 숙인 내 고개 아래로 얼굴을 들이밀고서는 고 고양이처럼 색기 자르르 흐르는 눈으로 '내가 안
부를 줄 알았어?'라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긴 그 눈을 기
억하는 것이 당연하지, 딱히 할 말도 없는 주제에 몇마디 뱉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신나간 놈
아니겠는가. 케빈도 그런 놈은 용서 안 해 줬을 것이다.
아, 고것 참. 그 눈. 그 눈. 열두살밖에 안 된게 앙큼하기도 하지. 얼마나 귀여웠다구. 얼마나 가슴이
쿵했다구.
그랬던 민희는 전학을 갔다. 살고 있던 집에서 걸어서 약 이십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내가 살던
곳에서는 약 이십이분쯤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
다. 이사를 간 뒤로 한 번 찾아간 민희의 집은 멀고도 멀었다. 갈 때야 날아서 갔지만 올 때의 가슴엔
바람이 불었다.
휘잉. 춥구나.
휘잉. 민희가 없구나.
휘잉. 민희는 멀리 사는구나.
휘잉. 시간이, 공간이 우리를 갈라 놓는구나.
휘잉.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휘잉. 이것이 우리의 이별이로구나.
휘잉. 훌쩍.
휘잉. 훌쩍훌쩍.
구년 후에 경남에서 올라온 여자를 사귀게 될지도 모르고, 십년 후에 강남에 살아서 그네 집까지 데
려다주고 인천 가려면 꼬박 세시간 반이 걸리는 여자를 사귀게 될 것도 모르고, 부평은 제 집 안방이
요 신촌은 지하철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여기게 될 것도 모르고,
열두살의 최대호는 지도에서 약지손톱만큼 되는 곳으로 이사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너무도 보고
싶어서 오열했었다. 그 행태와 후폭풍을 다시 떠올려보매, 오열이라 표현하는 것이 심히 어울린다.
시간은 십년도 넘어 해는 2003년을 넘겨가고 나는 스물셋을 넘기고 있다. 민희는 어떻게 됐는지 어
디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도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 친하지도 않았던 아이들 주소까지, 일부러 글
씨 큼직큼직하게 써 가며 한권을 겨우 채우던 그 작은 주소록. 지금엔 꼭 적어야 할 번호와 주소들
만 설렁설렁 적어도 아마 다섯권이 넘어갈 것이다.
걸어 이십분에 사는 여자친구라. 그것 참 부럽기도 하다. 강남은 앞마당이요, 강북은 뒷마당.
경기도는 산책로요 강원도는 소풍길. 경남 사는 사람이라도 올해안엔 보겠거니. 해외 나간 사람이라
도 죽기전엔 보겠거니.
글쎄, 모르겠다. 커버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는 분명 늘어났는데, 과연 그때 민희가 보고 싶었던 만
큼, 이별을 생각해야 했었을만큼 원망스러웠던 내 마음의 이십분 거리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과연 늘어는 났을까. 필시 짧아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얼마나 짧아졌을까.
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까.
과연 모르겠다. 다 때려치우고 민희나 다시 만나 얘기 좀 해 봤으면 좋을텐데.
주위 모든 것에 권태로워졌을 때에, 짜증이 났을 때에, 내가 스무살이 넘어 서울에서 쌓아 놓은 것
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알았을 때에,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서울의 모두가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을 때에,
민희가 생각나 날 구원할 줄이야. 하. 그것참. 결국 이것은 민희 이야기. 하나로 끝났다. 휘잉.
방 와서 레포트 안 쓰고 앉아 쓰는 이야기가 쓰면서도 재미가 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다.
때는 엑스포가 열리기 한해 전인 1992년으로 한정하자. 그러면 승학초등학교 5학년이고 나이는
케빈과 동갑먹는 열두살이다. 최대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 이거다.
동서고금에서 일급으로 꼽아주는 미녀가 언제나 그러하듯, 살짝 올라간 눈매에 탄력있는 피부가 한
방 제대로 먹어 주는 그녀의 이름은 내나이 열여덟 학익고등학교 2학년 4반 우리반 짱과 같은,
김민희.
아, 그 시간은 즐겁디 즐거웠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생각을 그 때 처음 했던 것도 같다. 누군가
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내가 더 즐겁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첫사랑은 아니
지만, 가히 첫 여자친구라 할만하다. 조숙하다 까졌다 어쩌구 이야기는 잠시 치워두자. 잠시 치워
둬 봐야 다시 이야기할 것도 아니니 그냥 잊도록 하자.
그래. 김민희가 있었다 이거지. 그럼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보자. 5학년 4반의 담임선생님의 성함은
노숙자 선생님이셨다. 워낙에 유쾌하고 외람되지만 발랄한 성격이시라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벌리셔서, 여기서 하나 예를 들고 넘어가자면 우리 반에서는 같이 앉는 짝도 자기가 같이 앉고 싶
은 아이를 골라 가지는 시간도 있었다. 여성의 상품화다라고 화내지 마시라. 소녀가 고르고 소년은
그 결과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런 짝고르기. 학기말이 가까워져 사실상 마지막 짝꿍을 고르게 되
었던 그 무렵에, 하필 그 무렵에 나는 민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 음란한 미국에서 자라난 케빈
도 여자친구가 인기가 좋은 데에는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 대는 와중에, 한국에서, 그것도 2003년이
되도록 제 1당은 한나라당 제1신문은 조선일보인 인천에서 잘도 자라난 열두살 소년은 실명을 거론
할 수 없는 어떤 친구가 민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의 비슷한 때에 그 사실을 민희
가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면서 대화를 줄이게 된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짝고르기라니 후회막급이다. 괜한 반항심으로 민희가 그 녀석이랑 앉으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 사과할걸 사과할걸하고 되뇌이고 있는데, 아 글쎄 민희가 당돌하게도 제 차례가 오자 선생님
의 '누구랑 앉겠니'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최대호요'라고 불러 준 것이다.
허허. 최대호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최대호'라고 내 성까지 불러 주
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권미랑은 태생적으로 점수를 반쯤 따고 들어가는 것
이나 다름없다.) 반장이나 회장님이나 의장님도, 오빠도 형도, 자기야 여보야도 다 그 나름으로 좋
지만, 최대호라는 이름만큼 내게 감흥을 주는 칭호는 없다. 그런 최대호를, 그런 민희가 대뜸 불러
준 것이다. 버릇없게시리 선생님 말도 기다리지 않고.
옆자리에 일단 앉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 내 얼굴이 사나워 보인다는
것을 민희는 잘 알고 있었고 민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또한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서로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하튼, 어찌할지 몰라 뚱하니 있는데 민희가 애기를 달래는 것처
럼, 숙인 내 고개 아래로 얼굴을 들이밀고서는 고 고양이처럼 색기 자르르 흐르는 눈으로 '내가 안
부를 줄 알았어?'라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긴 그 눈을 기
억하는 것이 당연하지, 딱히 할 말도 없는 주제에 몇마디 뱉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신나간 놈
아니겠는가. 케빈도 그런 놈은 용서 안 해 줬을 것이다.
아, 고것 참. 그 눈. 그 눈. 열두살밖에 안 된게 앙큼하기도 하지. 얼마나 귀여웠다구. 얼마나 가슴이
쿵했다구.
그랬던 민희는 전학을 갔다. 살고 있던 집에서 걸어서 약 이십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내가 살던
곳에서는 약 이십이분쯤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
다. 이사를 간 뒤로 한 번 찾아간 민희의 집은 멀고도 멀었다. 갈 때야 날아서 갔지만 올 때의 가슴엔
바람이 불었다.
휘잉. 춥구나.
휘잉. 민희가 없구나.
휘잉. 민희는 멀리 사는구나.
휘잉. 시간이, 공간이 우리를 갈라 놓는구나.
휘잉.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휘잉. 이것이 우리의 이별이로구나.
휘잉. 훌쩍.
휘잉. 훌쩍훌쩍.
구년 후에 경남에서 올라온 여자를 사귀게 될지도 모르고, 십년 후에 강남에 살아서 그네 집까지 데
려다주고 인천 가려면 꼬박 세시간 반이 걸리는 여자를 사귀게 될 것도 모르고, 부평은 제 집 안방이
요 신촌은 지하철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여기게 될 것도 모르고,
열두살의 최대호는 지도에서 약지손톱만큼 되는 곳으로 이사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너무도 보고
싶어서 오열했었다. 그 행태와 후폭풍을 다시 떠올려보매, 오열이라 표현하는 것이 심히 어울린다.
시간은 십년도 넘어 해는 2003년을 넘겨가고 나는 스물셋을 넘기고 있다. 민희는 어떻게 됐는지 어
디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도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 친하지도 않았던 아이들 주소까지, 일부러 글
씨 큼직큼직하게 써 가며 한권을 겨우 채우던 그 작은 주소록. 지금엔 꼭 적어야 할 번호와 주소들
만 설렁설렁 적어도 아마 다섯권이 넘어갈 것이다.
걸어 이십분에 사는 여자친구라. 그것 참 부럽기도 하다. 강남은 앞마당이요, 강북은 뒷마당.
경기도는 산책로요 강원도는 소풍길. 경남 사는 사람이라도 올해안엔 보겠거니. 해외 나간 사람이라
도 죽기전엔 보겠거니.
글쎄, 모르겠다. 커버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는 분명 늘어났는데, 과연 그때 민희가 보고 싶었던 만
큼, 이별을 생각해야 했었을만큼 원망스러웠던 내 마음의 이십분 거리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과연 늘어는 났을까. 필시 짧아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얼마나 짧아졌을까.
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까.
과연 모르겠다. 다 때려치우고 민희나 다시 만나 얘기 좀 해 봤으면 좋을텐데.
주위 모든 것에 권태로워졌을 때에, 짜증이 났을 때에, 내가 스무살이 넘어 서울에서 쌓아 놓은 것
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알았을 때에,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서울의 모두가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을 때에,
민희가 생각나 날 구원할 줄이야. 하. 그것참. 결국 이것은 민희 이야기. 하나로 끝났다. 휘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