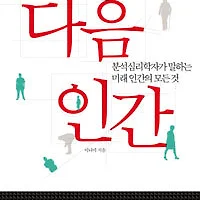딱히 잘하는 편도 아니지만, 혹여 작두를 타는 날이라 하더라도, 혼자만의 말재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점차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까운 지인들 또한 나이를 먹으며 각자 선호하는 화술의 방식과 주제의 영역이 천차만별로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 참 즐거운 대화였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화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을 때나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많았다. 서로간의 교통交通이 이루어지면 재미가 됐든 의미가 됐든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
세상에는 남의 말을 마냥 잘 듣고 있는 이도 많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본성에서 출발한 나는 딱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도 계속 듣고 있을만한 참을성도 갖추지 못했고 즐겁게 듣고 있는 척 하면서 머리 속으로는 여러가지의 멀티태스킹을 하는 뻔뻔함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혹은 노력에 의해서 내가 찾아낸 해답은 좋은 질문을 찾자, 였다. 말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나도 즐거울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찾자.
좋은 질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어봐주길 바라는 질문, 그것만은 묻지 않길 바라는 질문, 예상했던 질문, 예상치 못한 질문, 순수하게 질문 자체로서의 질문, 질문의 꼴을 한 제언이나 비판으로서의 질문 등등. 안다고 바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관심을 갖고 보니 소소한 성과들이 있었다.
더 좋은 질문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초기에서 주로 참고하였던 것 중의 하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내놓은 대중 교양서였다. 마음과 마음을 다루는 화술에 있어 정통한 일군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 중 대부분은 대화(상담)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로 얻어진 인간의 심리에 대한 성찰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성찰도 본질적으로는 논어나 탈무드 등에 제시된 교훈, 준칙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난 뒤로는 '시간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일단 보지 않는 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와중에 오래 전에 예약을 걸어두었던 이 책의 내 순서가 돌아왔다. 어쩔까 고민을 하던 나는 일단 시간을 들여 잡지는 말고 버스 등에서 쪽쪽이 읽기로 하자고 마음먹고 대출을 했다. 그리고 그날 목적지의 정거장을 세 개나 지나쳤다. 그만큼 재미있는 독서였다.
책의 기획은 이러하다. 이름난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이 삼십대 초반에서 사십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네 명의 한국 여성들과 집단 상담을 한다. 네 명의 여성들은 각기 이러한 기획이 있고 추후 책으로 출판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원한 이들이다. 상담(세션)은 두 시간씩 6회, 총 열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제는 '관계'이다.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책의 본문은 각 세션 별로 한 장씩을 할당한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다. 세션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를 마치 연극의 극본처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정혜신이 의미있게 관찰한 신체 언어, 즉 동작들도 극본의 지문처럼 괄호 안에 표기된다.
내용이 진행되는 중 참가자의 내면이 드러나는 때, 혹은 감정의 진폭이 있을 때 등에는 실제 상담 중에는 있지 않았던 정혜신의 인상과 분석이 삽입된다. 파란 글씨로 인쇄되어 있고 들여쓰기를 하고 있어 금세 눈에 띈다. 극본으로 말하자면 주인공, 혹은 관찰자 배역의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그렇게 한 장이 끝나고 나면 그 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심리, 현상 등을 설명해주는 '정혜신의 힐링톡'이 한 쪽 덧붙고 다시 다음 장이 시작된다.
네 명의 참가자들은 각기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형의 인물들이다. 1장이 시작되기 전 제시되는 나이와 직업, 간단한 성격묘사에 관한 정보를 읽으며 응, 일부러 평범한 사람들 골랐구나, 하던 정도의 인상은 내용을 읽으며 캐릭터가 입체화될수록 맞아, 주변에 이런 사람 정말 있어, 라는 공감을 일으킨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든다. 아, 그 사람은 이런 때 이렇게 느꼈겠구나. 나는 정말 몰랐다.
남다른 과시나 지나친 예의로 서로를 경계하던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서로를 일정 부분 치유하기에 이른다. 요약해놓고 보면 다소 작위적으로 보이는 이 흐름은, 그러나 작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대로 옮겨놓은 대화에서 독자가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감'이 특히 좋았던 부분은 결말부였다. 마침내 여섯 번째의 세션이 끝나고 서로 좋은 말로 마무리하려는 참가자들에게 정혜신은 문득 여기저기 딴죽을 건다. 방금 했던 그 좋은 클로징 멘트. 그런데 그것은 정말이냐. 진심이냐. 왜냐하면 정혜신도 알고 우리도 알듯이,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란 전문가와의 고작 여섯 번의 세션으로 '매끈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세션에서 얻었던 소소한 깨달음과 새로운 질문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한다.
독후감. 아주 좋아했던 TV시리즈 '인 트리트먼트In Treatment'를 보던 때의 즐거움으로 읽었다. 좋은 질문의 사례와 타이밍에 대해서도 배우고, 아울러 사례와 타이밍보다 - 윤리적으로, 혹은 최소한 효용성에 있어 -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것도 배웠다. 묻는 사람의 포지션으로서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서도, 마음을 여는 법, 열고 유지하는 법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점이 많았다. 이런 책을 기획해 준 기획자와 상담 역을 맡아준 정혜신 씨,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불편함을 직면하고 속 이야기를 계속해서 털어놓아준 상담자들에게 모두 고마운 마음이 든다.
독서를 마친 뒤에 인상적이었던 순간 하나. 책을 읽으며 옆에 이면지를 두고 눈에 띄는 부분을 옮겨적거나 혹은 그때그때 드는 생각을 적어두었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면지를 들고 죽 훑어보니 인상적 발언, 혹은 심리학 이론을 인용해 둔 사이사이로 '불편'이라는 내 언급이 눈에 띈다. 특히 어디에 집중되었나 살펴보니 대부분 한 상담자가 두렵거나 아픈 내면을 드러내었을 때, 혹은 그런 면을 극복해내었을 때 정혜신이 삽입해 둔 나레이션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 안아주고 싶어라', '여린 사람',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다' 등의 언급에 나는 특별히 불편함을 느꼈다.
분리해서 말하자면, 나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이 분석한 대화의 맥락, 혹은 심리학적 분석에는 크게 만족하였지만 '큰언니' 같은 정혜신이 토해낸 감성적 인상에는 즐거운 독서를 잠시 멈출 정도의 불쾌함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그 특성을 들어 '이 책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기술한 뒤 끝냈을 것인데, 이번에는 내가 왜 그 부분을 특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꼈을까, 나는 왜 그 부분을 특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생각 중이다.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 이 책, 다시 한번 고맙다. 성별과 국적, 연령대 등을 달리하여 같은 기획의 책이 계속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독서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봉규, <현판기행> (담앤북스. 2014,7.) (1) | 2014.10.02 |
|---|---|
| 박인하, <만화공화국 일본여행기> (랜덤하우스. 2009, 7.) (2) | 2014.10.02 |
| 이나미, <다음 인간> (시공사. 2014, 8.) (2) | 2014.09.19 |
| 이경석 外, <섬과 섬을 잇다> (한겨레출판. 2014, 5.) (0) | 2014.09.17 |
| 원종우, <태양계 연대기> (유리창. 2014, 7.) (0) | 201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