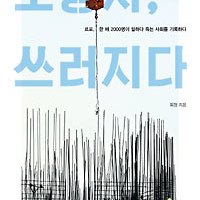좌절과 슬픔이 되었든 위안과 희열이 되었든 내 삶에 가장 많고 깊은 생각과 감정을 가져다준 단일한 사물은 역시 책이다. 어렸을 때 즐겨 하던 어떤 일들은 때로 내 취향이 변하여서 그치기도 하고 때로 그것이 생업의 일부가 되어서 더이상 즐기지 못해 그치기도 하지만, 읽고 쓰는 일만은 즐겁기를 멈추는 일이 없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본가의 널찍한 책장에 도토리가 다람쥐 모으듯 책을 사서 꽂아넣는 것이 또 하나의 비밀한 취미였다. 어느 정도의 양이 모여서 마침내 카테고리 하에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우쭐함이 아직도 기억난다.
스무 살이 넘어서는 십 년이 지나도록 그 호사를 누리지 못했다. 언제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르거니와 타향의 월세살이에는 마음이 흡족할 만큼의 책을, 살 돈도 놓아둘 곳도 지고 이사할 요량도 없었던 탓이다. 장서의 양이나 이용 편의성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는 모교의 도서관을 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며 자위하고 지냈다.
사단은 한 온라인 서점의 오프라인 중고책방 때문이었다.
중고책방은 예전에도 타향 생활에 지치면 홀로 찾아 마음을 위로하던 곳이었다. 십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신촌 인근에는 서울 지역에 이름난 중고책방이 적어도 세 군데는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골목골목을 돌아 점집 옆에 있는 한 책방을 무척 좋아했는데, 들어가는 이를 맞아들이는 매큼한 곰팡이 냄새, 밖에서는 분명 점잖은 사람들이겠지만 바로 여기 헌책 앞에서는 탐욕스러운 눈을 감추지 못하는 서벽書癖들, 그리고 단순히 오래되었을 뿐인 심상한 책들 사이로 보석처럼 숨어 있는 양서들 등 이런저런 즐거움이 가득했던 기억이 난다.
2000년대 후반에, 유명 온라인 서점 중 하나가 오프라인 중고책방을 개설했다. 신촌에는 이미 일본의 최대 중고 책방 브랜드가 들어와서 죽을 쑤고 있는 판이었다. 중고책방이라면 으레 앞서 말했던 즐거움들이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나는, 대규모 중고서점이라니, 애서가와 장서가들의 취향을 전혀 모르는구만, 하고 짐짓 혀를 찼던 것이다.
그리고 5, 6년 여가 지난 지금, 나는 전화세와 카드값이라도 이렇게 달마다 열심히 꼬박꼬박 갖다 바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중고서점의 노예가 됐다. 주요 동선마다 매장이 있는 것도 한몫 했지만 이전의 헌책방 같으면 몇차례고 방문해야 하나쯤 건질까 말까 하던 내 관심 서적들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주루룩 늘어서 있고 편리하게 검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책값은 차츰 올라 이제 300쪽 짜리 신간 세 권을 집어들면 오만 원 한 장이 지갑에서 뎅강 잘려나갔는데, 같은 돈으로 이곳을 찾으면 못해도 열 권은 넉넉히 집어들 수 있었다. 나는 돈이 없고 보관할 곳이 없어 학교 도서관에서만 몇 차례고 읽었던 예전의 신 포도들을 복수하듯이 사 모았다.
그래서 사단이 난 것이다. 고시원이나 목욕탕을 전전하던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큰 창 달린 방 하나 마련하고 사람 사는 꼴은 최소한 갖추었다지만, 집 한 채도 아니고 방 한 칸이 감당할 수 있는 책의 양이란 뻔하다. 책장 두 개 분량의 책을 고향 본가의 내 방으로 보내고 나서도 방에는 책이 대책 없이 쌓였다. 책이 무릎 높이 이상 쌓이기 시작하면 아래쪽의 책은 빼내기가 귀찮아 손에서 멀어진다. 읽지 않고 그저 갖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싫어 나는 높지 않은 책더미를 방의 이곳저곳에 제주의 오름처럼 만들어두었던 것인데,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마침내 책을 밟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떼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눈을 딱 감고, 나는 침대의 머리맡에 책들을 쌓아올렸다. 평상시에 가장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침대의 폭에 맞추니 네 줄이 올라갔다. 다 쌓고 나니 키보다 조금 모자랐는데, 그마저도 그 사이 주문해 놓았던 책들이 새로 오자 키와 맞춰졌다. 그렇게 정리한지 두어달이 지난 지금은 머리 위쪽 말고 옆쪽으로도 새 줄이 생겨 책탑은 ㄱ 자 모양이 되었다. 지진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잠버릇이 고운 편이라 저지를 수 있었던 무식한 짓인 셈이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인死因은 자다가 책에 깔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우는소리 하는 나도 갖고 있는 책을 다 세어보면 삼천 권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나는 못해도 만 권 이상의 책을 갖고 있는 장서가, 혹은 서치書痴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내가 가진 고충과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을 갖고 또 아직 겪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들을 들으며 가벼운 좌절과 무모한 흥분을 느낀다. 모두, 이 작고 네모난 종이뭉치에 혼을 빼앗긴 자들이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높고높은 책무덤에 한 권 더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책, 오카자키 다케시岡崎武志의 <장서의 괴로움>이다.
다케시武志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 실제로 있는 것 중에서는 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만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저자는, 실은 '대략 2만 권', '잘못하면 3만 권'의 책을 지닌 장서가이며, 책과 헌책에 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해 그 돈으로 또 책을 사는, 그야말로 책의 노예 중 상노예이다. 그런 그가 이름난 장서가들의 에피소드, 헌책의 매입 노하우, 관리의 괴로움, 그리고 장서의 철학 등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장서가나 장서가 지망생이라면 환장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일본 작가 특유의 유쾌하고 귀여운 문체로 촘촘이 엮었다.
독후감을 다 쓰고 나면 항상 이 책은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한다. 그런데 이 책은 그간 독후감을 써온 작품들 중에 추천할 이들이 가장 명확하고 또 좁은 책이다. 장서가가 아닌 독자가 읽는다면 이 책의 내용은 허황되거나 혹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일 테다. 어떤 이는 그 탐욕과 무모함에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다. 책을 보관하는 괴로움에 대한 책을 보관하다니. 그래서 이 책은 오롯하게 만권루萬券樓나 오거서五車書 따위의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 고대로부터 암약해 온 자들만을 위한 책이다. 냉난방비는 생각도 않고 1층부터 3층까지를 꿰뚫는 책장이 있는 집을 지을 꿈만을 꾸는 자들만을 위한 책이다. '책 훔친 만용담'이 있을까 조마조마하며 읽었다는 장정일의 추천사부터 시작해, '(이 책을 쓰면서) 책이 너무 늘어 걱정이란 투정은 결국 자랑삼아 자기 연애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저자 후기까지, '책빠'의 마음을 이토록 후벼파고 위로하는 팬북이 다시 있을 수 있을까. 끌린다면 두 권 사자. 이미 산 줄 모르고 다시 사는 것 또한 장서가의 미덕이므로.
'독서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희정, <노동자 쓰러지다> (오월의 봄. 2014, 6.) (5) | 2014.11.09 |
|---|---|
| 강성률,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 (한겨레출판. 2014, 7.) (0) | 2014.11.09 |
| 김봉규, <현판기행> (담앤북스. 2014,7.) (1) | 2014.10.02 |
| 박인하, <만화공화국 일본여행기> (랜덤하우스. 2009, 7.) (2) | 2014.10.02 |
| 정혜신, <당신으로 충분하다> (푸른숲. 2013, 6.) (2) | 201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