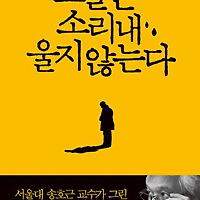읽은 감상 한 마디 먼저. 산뜻하다!
책 좋아한다는 사람들에게 몇 차례고 추천받아왔던 필자인 강상중 세이가쿠인 대학 교수의 2013년 신작. 부제
는 '강상중의 도시 인문 에세이'. 베스트셀러를 몇 편이나 낸 인기 저자이지만, 아무튼 이 독서일지에는 처음 등
장이다. 본문과 책날개를 빌려 간단한 소개를 옮겨보자.
저자는 일본 구마모토 현 출신의 재일 동포이다. (얼마 전 읽었던 소준섭 선생의 신간에서, 교포僑胞의 교僑는 더부살이하
다, 얹혀 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동포라고 불러야 한다는 지적을 접한 바 있었다. '재일 교포' 쪽이 익숙하기도 하고, 동포
라는 단어에는 민족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동포 쪽이 좀 더 정당한 표
현인 것 같아 그렇게 써 본다.) 대학 시절까지 '나가노 데쓰오'라는 이름을 썼고,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데쓰오'라고 불렀다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겪었고, 스무 살 무렵 서울에 사는 숙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찾았다가 큰 충격을 받고 그 때부터 '강상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 정치학
과 정치 사상사를 전공하였고, 1998년 재일 동포로는 처음으로 도쿄대의 정교수가 되었다. '일본 근대화 과정과
전후 일본 사회, 동북아 문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일본 지식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
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저작 중 <고민하는 힘>과 <살아야 하는 이유>가 화제에 오른 바 있다. 나는 그 제목만 보
고서는 실용서의 냄새를 지레 맡고 피해 있다가, 구미가 동하는 제목의 이번 신간으로 그를 처음 접하게 됐다.
원제는 <Tokyo Stranger>로 직역하면 <도쿄 이방인>이 될텐데, <도쿄 산책자>라는 한국어판 제목은 아마도 벤
야민의 산책자에서 온 것일 것이다. 이 책에서 영감의 재료로 삼는 도쿄가 에도에서 변신한 직후의 도쿄가 아니
라 2장의 제목대로 '모던, 포스트모던, 그 이후'를 겪은 도시성의 공간이며, 그 사이를 걷는 필자는 일본인, 한국
인, 소비자, 학자로서의 고민을 거쳐 마침내 '강상중'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 관
찰자라는 점에서, 원제가 갖는 재미의 크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구성은 명료하다. 재일 한국인, 50년 생의 일본인, 인문학자, 그 모든 면모를 가진 '강상중'이 도쿄의 명소를 돌
아다니며 그 곳에서 떠오른 이야기를 조곤조곤 전해 준다. 프롤로그의 '서울'을 포함해 총 30곳의 장소가 소개
되어 있으며, 한 장소당 6-8쪽의 분량이 할당된다. 어느 곳에서는 장소에 얽힌 유년기의 추억을 가볍게 회상하
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현대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를 진단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인간과 문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기도 한다.
그러니, 도쿄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다시 확인해 보려는 일본 여행객이라면 조금이라도 읽어본 뒤 완독할지 말지
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당 장소의 사진은 흑백으로 몇 장이 나올 뿐이고, 이 장소들은 대체로 필자가 이끌
어 나갈 이야기의 애피타이저 역할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의 추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에는 장소
나 분위기의 묘사 등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그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사, 사회적 의미로부터 인문학
적 논의가 종횡무진으로 뻗어나간다. 이를테면, '수조 안은 안전합니까'라는 부제의 '시나가와 수족관' 편에서는
이 수족관에 대한 소개나 언급 한 줄 없이 곧장 '현대 사회에서의 안전과 감시'라는 논제로 곧장 돌진한다.
그러나 중량감 있으면서도 어렵지는 않은 인문학 서적을 접하고자 했던 독자라면 거리낄 것이 없겠다. 짧은 분
량에 얼마나 무게를 담을 수 있을까, 무척이나 전문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을까, 등이 고민된다면,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잘 정리되면 이렇게나 쉽게 읽히는구나, 하고 감탄했던 독서였음을 말
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화제에 대해 속속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가들이 보여주는 경지이다.
믿고 눈과 시간을 맡겨도 좋을 것 같다. 일본 작가 특유의 상냥한 시선과 곰살스런 문체는 덤이다.
편과 편 간의 뚜렷한 연관성이 없고, 한 편의 짧은 분량에 비해 정보의 넓이나 곱씹어볼 깊이가 굉장하기 때문
에, 선 채로 주루룩 읽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편 한 편씩 읽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대체로 그냥 한 번
읽고 독후감을 쓰며 가볍게 한 차례 다시 읽은 뒤 당일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나도, 이 책만은 머리맡에 놓
아 두고 몇 차례에 나누어 다시 읽어보기로 했다. 스스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다.
'독서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송호근,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와우. 2013,3.) (2) | 2013.05.31 |
|---|---|
| 조던 매터,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SIGONGART. 2013, 4.) (1) | 2013.05.29 |
| 허소희 外, <종이배를 접는 시간 - 한진중공업 3년의 기록> (삶창. 2013, 5.) (2) | 2013.05.24 |
| 김기태, <병원 장사> (씨네21북스, 2013, 3.) (10) | 2013.05.17 |
|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아포리아. 2013,3.) (1) | 2013.05.14 |